출이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인생에서 꽤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행복과 불행에 관한 교훈을 주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은 출이반이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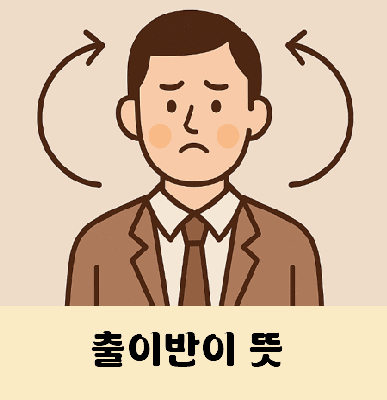
출이반이(出爾反爾) 뜻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한자를 알면 해석이 쉽습니다.
出 (날 출) 爾 (너 이) 反 (돌이킬 반) 爾 (너 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가 모두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자초하는 면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인데요.
이게 줄임말입니다.
원래는 ‘출호이자반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호이자반호이(出乎爾者反乎爾)의 줄임말
이 말은중국 고전 ≪맹자≫의 「양혜왕하」 편에 실린 이야기 중, 유학의 큰 스승 증자(曾子)의 말이 인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정치와 도덕, 그리고 백성과 지배자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추나라의 통치자였던 추목공(鄒穆公)은 어느 날 맹자에게 중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노나라와 벌인 전투에서 고위 장수들만 무려 서른 세 명이나 전사했소. 그런데 정작 그 지휘관들을 따르던 병사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소. 눈앞에서 상관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무도 목숨 걸고 함께 싸우지 않았다면 그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소? 이들을 모두 처벌하려 해도 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다음에도 상관이 죽어도 남 일처럼 구경만 할 게 뻔하오.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좋겠소?
이때 맹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제자 증자(曾子)의 말을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냉담하게 행동한 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무정하거나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껏 그들이 윗사람에게 받아온 대우가 그러했기 때문이지요.
맹자는 여기서 ‘주종(主從) 관계는 강압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와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드러냅니다.
맹자의 말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임금이 인애를 바탕으로 백성을 보살핀다면, 군사들은 스스로 상관의 은혜에 보답하려 할 것입니다. 은덕을 깊이 느끼는 이들은 명령이 없어도 앞장서서 싸우고, 심지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설 것입니다.
즉, 맹자가 추라나라 목공에게 출호이반호이라는 말을 인용하여 백성들이 충성스럽지 못한 것을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맹자가 주장했던 왕도정치가 잘 드러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출이반이 뜻과 원래 표현인 출호이반호이(出乎爾反乎爾)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출이반이는 원래 위정자의 어진 정치와 관련된 교훈을 주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개인에게 적용하면 복과 화는 모두 자기로부터 나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현재는 사용되고 있습니다.